족보 : 서열,존칭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답변이 힘드네요.
개별질문을 해보세요ㅠㅠ
아래 내용은 참고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제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옹달샘 www.love-119.com > 커뮤니티 > 알면도움이 되는 상식에 자료들이 많으니
호칭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아버지의 형제(남계親), 자매(여계친=內계親=姑계親의 우두머리)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아버지의 형
⇒ 큰 아버지, 둘째 큰 아버지, 셋째 큰 아버지
아버지의 형의 배우자(=아버지의 형수)
⇒ 큰 어머니, 둘째 큰어머니, 셋째 큰 어머니
★아버지의 남동생
⇒ (결혼전) 삼촌
(결혼후) 작은 아버지(숙부님, 제부님)
아버지의 남동생의 배우자(=아버지의 제수씨)
⇒ 작은 어머니, 숙모님
★아버지의 누이[누님(=매씨), 여동생]
⇒큰 고모, 작은(둘째) 고모
아버지의 누이의 배우자
[=아버지의 매부{자형(누님(=매씨)의 夫), 매제(여동생의 夫)}]
⇒큰고모부, 작은(둘째)고모부
② 아버지의 종형제[바깥계(=남계)], 종자매[여계(=내계)의 우두머리]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아버지의 종형제
⇒ 종숙(=당숙), 종아제(=당아재)
☞ 아제(or아재) : 아저씨의 친근한 말(사투리)
아버지의 종형제의 배우자
⇒종숙모(=당숙모), 종아짐(=당아짐)
☞ 아짐 : 아주머니의 친근한 말(사투리)
★아버지의 종누이(종누님, 종여동생) ☜ 부계의 여계친(內계) 두목
⇒종고모(=당고모)
아버지의 종누이의 배우자
[=아버지의 종매부{자형(종누님)의 夫, 매제(종여동생)의 夫}]
⇒종고모부(=당고모부)
③아버지의 재종, 삼종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아버지의 재종, 삼종 형제
⇒ (재종, 삼종) 아제
아버지의 재종, 삼종 형제의 아내
⇒ (재종, 삼종) 아짐
★아버지의 재종, 삼종 누이 ☜ 부계의 여계친(내계=고계)의 두목
⇒ (재종, 삼종)고모
아버지의 재종, 삼종 누이의 남편(=아버지의 재종, 삼종 매부)
⇒ (재종, 삼종)고모부
☞㉮종(從;4,5촌),재종(再從;6,7촌),삼종(三從;8,9촌),사종(四從;10,11촌)은 방계혈족에 붙이는 접두사로서 나와 항렬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나를 기준으로 4(5)촌, 6(7)촌, 8(9)촌, 10(11)촌 사이라면 무조건 종,재종,삼종,사종이라는 촌수칭 접두사를 붙인다. 단지 2, 3촌은 고 유명사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짝수차 항렬라인의 방계혈족이면 각각 4, 6, 8, 10의 짝수촌이 됨에 반해, 홀수차 항렬라인의 방계혈 족이면 각각 5, 7, 9,11의 홀수촌이 될 뿐이다.
㉯방계 할아버지는 부계의 바깥계(=남계)의 방계친으로서 비록 나의 친할아버지와 친형제지간이지만 나와는 접두사가 붙을 필요가 없 는 2, 3촌 방계지간이 아니므로 역시 촌수칭 접두사 즉 종,재종, 삼종,사종이 붙는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백조부,중조부, 숙조부가 아니라 종조부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다만 첫째 종조 할아버지, 둘째 종조 할아버지라고 하여 손위 손아래를 표시 한다.
④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
★할아버지의 형 ☜ 父系의 男系(=바깥계)
⇒ 큰(둘째) 종조부, 큰(둘째) 종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의 아내(할아버지의 형수)
⇒ 큰(둘째) 종조모, 큰(둘째) 종조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남동생 ⇒ 작은 종조 할아버지 ☜ 부계의 남계친
할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 작은 종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누이(아버지의 고모) ☜ 부계의 여계친= 내계= 姑系
⇒ 대고모, 왕고모, 고모 할머니
cf. 어머니의 이모 ⇒ 외이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누이의 남편(아버지의 고모부)
⇒ 대고모부, 왕고모부, 고모부 할아버지
⑤할아버지의 종,재종,삼종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종자가 붙은 종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친형제로서 나와 방계 4촌 지간이라서 종 자가 붙은 것이지 할아버지의 종형제라서 종 자가 붙은 것이 아님에 주의)
⇒할아버지의 4촌 종형제는 나와 6촌지간이므로 재종을, 재종형 제는 나와 8촌지간이므로 삼종을, 삼종형제는 나와 10촌지간이 므로 사종이라는 촌수칭 접두사를 붙이는 것을 빼고는 할아버 지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과 같음
⑥형제(부계의 남계),자매(생계;甥 자 붙는 부계안의 여계)와 그 배우자 를 부르는 호칭
★형과 그 아내를 부르는 말
형 ⇒ 큰형(님), 둘째(작은)형(님)
형의 아내 ⇒ 큰형수, 둘째(작은)형수
★형이 남동생과 그 아내를 부르는 말
남동생 ⇒ 남동생이름, 아우, (남동생 큰애이름)아범
남동생의 아내 ⇒ (주소지) 제수(弟嫂)씨, 계수(季嫂)씨
★오라버니(오빠)와 그 아내를 부르는 말 ☜ 부계의 남계
오빠 ⇒ 큰오빠(큰오라버니), 둘째(작은) 오빠(오라버니)
오빠의 아내 ⇒ 큰올케, 둘째 올케
★오라버니(오빠)가 여동생과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 생계= 부계의 여계친의 하나
여동생 ⇒ 여동생의 이름, (여동생의 큰애이름)어멈
여동생의 남편 ⇒ 매제(妹弟), 매부(妹夫), (성씨)서방
★남동생이 손위 누이와 그 남편을 부르는 말
☞ 생계(부계안의 여계친의 일종)
손위 누이 ⇒ 누나, 누님
손위 누이의 남편 ⇒ 자형, 매형
☞ 자매(姉妹)에서 자는 손위 누이를, 매는 손아래 누이 즉, 여 동생을 가리키므로 매형보다는 자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
★손위 누이가 남동생과 그 아내를 부르는 말 ☜ 부계의 남계
남동생 ⇒ 남동생 이름, (남동생 큰애이름)아범
남동생의 아내 ⇒ 올케, (올케의 큰애이름)어멈
★여동생이 언니와 그 남편을 부르는 말
☞ 이계(姨系)= 이 자 붙는 부계의 여계친의 하나
언니 ⇒ 언니, 형님
언니의 남편 ⇒ 형부, 큰형부, 둘째(작은) 형부, (주소지)형부
★언니가 여동생과 그 남편을 부르는 말 ☜ 이계
여동생 ⇒ 여동생 이름, (여동생 큰애이름) 어멈(엄마)
여동생의 남편 ⇒ (성씨) 서방(님), 제부
⑦바깥계 형제자매, 내계 형제자매, 외계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 르는 호칭
⇒ 4촌지간이라서 종,내종,외종과 같이 從 字가 들어가는 것을 빼고는 친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과 같음
⑧친조카들과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조카(형제, 출가전 오빠, 남동생의 아들;nephew)
⇒ (조카 이름)조카, (조카 큰애이름)아범
조카의 아내
⇒ (주소지)조카며느리, 질부, (질부 큰애이름)어멈
★조카딸(형제의 딸;niece)
⇒ (조카딸 이름) 조카(딸), 질녀, (조카딸 큰애이름)어멈 조카딸의 남편
⇒ (주소지)조카사위, 질서, (성씨)서방, (주소지) 서방
★생조카(누이의 아들;nephew)
☞ 생계 : 생 자 붙는 부계의 여계친
⇒ (조카 이름)생조카,생질(甥姪), (생조카 큰애 이름) 아범
생조카의 아내
⇒ (주소지)생조카며느리, 생질부, (생질부 큰애이름)어멈
★생조카 딸(누이의 딸)
⇒ (생조카 딸 이름)생조카딸 ,생질녀(甥姪女), (생조카딸 큰애 이름) 어멈
생조카딸의 남편
⇒ (주소지)생조카사위, 생질서, (성씨)서방, (주소지) 서방
★이조카=이질 (자매의 아들)
⇒ (이조카 이름)이조카, 이질(姨姪), (이조카 큰애 이름) 아범
이조카의 아내 = 이질부
⇒ (주소지) 이조카 며느리, 이질부,(이질부 큰애 이름)어멈
☞ 이종조카(이종질) : 이종사촌의 아들
⇒ (주소지)이종 조카, 이종질, (성씨)서방
★외조카=외질 (출가한 여자의 친정 오빠, 남동생의 아들)
cf. 출가전에는 그냥 질로 부름
⇒ (외조카 이름)외조카, 외질(外姪), (외조카 큰애이름) 아범
☞ 외종조카(외종질) : 외종사촌의 아들
⇒ (주소지)외종 조카, 외종질, (성씨)서방
⑨종,재종,삼종 조카들과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
★종,재종,삼종 조카
⇒ (조카 이름)종조카,재종조카,삼종조카
(주소지)종질, 재종질, 삼종질
(종질,재종질,삼종질 큰애이름)아범
종,재종,삼종 조카의 아내
⇒ (주소지)종조카 며느리,재종 조카며느리,삼종 조카며느리
(주소지)종질부,재종질부,삼종질부
(종질부,재종질부,삼종질부 큰애이름)어멈
★종,재종,삼종 조카딸
⇒ (종,재종,삼종 조카딸 이름) 종,재종,삼종 조카(딸)
(종,재종,삼종)질녀
(종,재종,삼종 질녀의 큰애이름)어멈
종,재종,삼종 조카딸의 남편
⇒ (주소지)종,재종,삼종 조카사위
(주소지)종,재종,삼종 질서
(성씨)서방
⑩ 내종,외종 조카들과 그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
★내종,외종 조카와 그 배우자
⇒ 4촌 사이므로 내종, 외종과 같이 從 字를 앞에 붙이는 것 을 빼고는 친조카와 그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과 같음
★내종,외종 조카딸과 그 배우자
⇒ 4촌지간이라서 내종, 외종과 같이 從 字를 앞에 붙이는 것 을 빼고는 친조카딸과 그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과 같음
백숙부 : 백부는 아버지의 친형, 숙부는 아버지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백숙부란 아버지의 친 남형제 모두를 말하며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종백숙부 : 종백부는 아버지의 사촌형, 백숙부는 아버지의 사촌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백숙부란 아버지의 사촌 남형제 모두를 말하며 역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종형제 : 종형제란 어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4촌관계입니다.
재종형제 : 재종형제란 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형제 : 말 안해도 알겠죠?
내재종형제 : 내재종형제란 대고모, 즉,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의 아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내종숙 : 내종숙이란 대고모, 즉,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의 아들로써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을 말합니다.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대고모 : 대고모란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를 말합니다.
질 : 질(姪)이란 조카의 한자어입니다. 조카란 본인의 형제나 4촌형제, 6촌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친조카, 즉, 본인의 형제의 자녀를 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종질 : 내종질이란 고모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내재종질 : 내재종질이란 대고모의 아들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7촌관계입니다.
생질 : 생질이란 본인의 누나나 누이동생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3촌관계입니다.
종질 : 종질이란 자신의 종형제의 자녀, 즉, 본인의 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재종질 : 재종질이란 본인의 증조부(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재종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의 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본인과는 7촌관계입니다.
삼종손 : 삼종손은 남자 재종질의 자녀로 본인에게는 손자뻘이며 8촌관계입니다.
재종손 : 재종손이란 종질의 자녀로 본인에게는 손자뻘이며 6촌관계입니다.
이손 : 이손이란 생질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4촌관계입니다.
손자녀 : 말 그대로 자신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종손 : 종손이란 자신의 조카의 자녀, 즉, 자신의 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내재종손 : 내재종손이란 남자 내종질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내삼종손 : 내삼종손은 남자 내재종질의 자녀로 본인과는 8촌관계입니다.
이종질 : 이종질은 이종형제의 자녀, 즉,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외종질 : 외종질은 외종형제의 자녀, 즉, 어머니의 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외종형제 : 외종형제는 외삼촌의 아들, 즉,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종형제 : 이종형제는 이모의 아들, 즉,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을 말합니다
남매간: 4촌끼리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끼리
고숙질간(姑叔姪間) : 고모와 친정조카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고 · 내종(枯內從) :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이질(姨姪) :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남매간: 4촌끼리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 · 녀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시누이와 올케 처남과 매부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끼리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외숙질간 : 누이의 아들과 외숙(어머니와 남매) 종(從) 형제 · 자매
(::사촌이상은 '종' 조카는 '질' 용어 사용::)
“어서 와서 세배 드려라… 이쪽은 재당숙으로 종증조부의 손자
가 되신다. 너에게 7촌 아저씨가 되는 거지.”
“…”
대학생 신유철(24·서울 강동구 천호동)씨는 해마다 설이 되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달리 친척이 많은 신씨는 설날
만 되면 한번 스치듯 만나는 친척들의 호칭이나 촌수를 알지못해
아버지에게 ‘꿀밤’맞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웃’보다 먼 친척의 촌수를 셈하기란 말
처럼 그리 쉽지 않다. 특히나 읽기조차 힘든 호칭은 외우기 어려
워 꿀먹은 벙어리마냥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기 일쑤다. 올해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칭과 촌수를 익혀보자. 귀찮
다고 친척을 보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친척의 호칭과 촌수를 안
다면 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몇촌사이일까?〓촌수는 한마디로 ‘혈연적 거리’를 측정
하는 셈법이다. 어느 친척이 나와 혈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멀리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체계라 하겠다.
우선 내가 촌수를 알고자 하는 친척과 동일직조(同一直祖:동일할
아버지)를 찾는다. 그리고 나와 동일직조의 촌수차이와 친척과
동일직조의 촌수차이를 더하면 나와 친척과의 촌수를 알 수 있다
. 도표에서 예를 들어보자. 나(A)와 재당숙(B)과의 촌수를 알려
면 가장 먼저 동일직조를 찾는다. 나와 재당숙의 동일직조는 고
조할아버지다. 고조할아버지와 나는 4촌사이이며 고조할아버지와
재당숙은 3촌사이이므로 나와 재당숙은 7촌 사이다.
나와 같은 항렬(형제)일 경우 할아버지가 같으면 4촌, 증조할아
버지가 같으면 6촌,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8촌이다. 나보다 한
항렬위(숙항)일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같으면 3촌, 증조할아버지
가 같으면 5촌,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7촌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나와 항렬이 큰차이가 없다면 촌수가 짝수일 경우 형제이고
홀수일 경우 숙부나 조카가 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촌수를 따지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와 자녀
, 할아버지와 손자·녀 그리고 부부-형제사이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를 1촌, 그리고 형제를 2촌으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셈을 하기위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본종이 아
닌 내종(고모) 또는 외종(어머니)일 경우 4촌만 따질 뿐 그 이상
따지지 않는다.
◈촌수보다 어려운 호칭〓우선 나와 4촌형제일 경우 종(從)형제
라고 한다. 그리고 6촌형제는 재종(再從)형제, 8촌형제일 경우 3
종(三從)형제, 10촌형제일 경우 4종(四從)형제라고 부른다. 나와
한 항렬위인 아저씨일 경우 3촌은 백부·숙부이며 5촌일 경우
당숙으로 부르며 7촌일 경우 재(再)당숙이다. 조카를 호칭할 때
는 질(姪)을 사용한다. 나의 친형제의 자녀일 경우 평소처럼 조카(
姪)라 부르면 된다. 4촌형제의 자녀는 종질(從姪), 6촌형제의 자
녀는 재종질(再從姪) 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친척을 부르면서 호칭을 쓰지 않고 ‘삼촌’‘사촌’‘
오촌’‘외삼촌’등 촌수로 부르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는 잘못
된 예다. 삼촌은 ‘숙부’, 사촌은 ‘종형·종제’, 오촌은 ‘당
숙부’, 외삼촌은 ‘외숙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거나 남편 여동생인 시누이를 고모로
부르는 등 아이들 입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것도 고쳐야 할 부분이다.
부를 대상자가 많아 헷갈릴 경우 지역이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인천당숙, 부산종형, 천호동 재당숙 등
으로 부르면 혼동될 염려는 줄어들 것이다. 성균관 전례연구위원
황의욱 위원은 “촌수를 아는 것은 혈연적 근원을 찾는 것이며
호칭은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며 “친척의 호칭과 촌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
을 바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증조부 ㅡ> 할아버지의 아버지
진외증조부 ㅡ> 할머니의 아버지
고조부 ㅡ> 증조부의 아버지
증외고조부 ㅡ> 증조모의 아버지
진외고조부 ㅡ> 진외증조부의 아버지
진외증외고조부 ㅡ> 진외증조모의 아버지
외고조부 ㅡ> 외증조부의 아버지
외증외고조부 ㅡ> 외증조모의 아버지
외외고조부 ㅡ> 외외증조부의 아버지
외외증외고조부 ㅡ> 외외증조모의 아버지 증조부 ㅡ> 할아버지의 아버지
진외증조부 ㅡ> 할머니의 아버지
외증조부 ㅡ>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외외증조부 ㅡ> 외할머니의 아버지
- [친족·친척 촌수·호칭 완전정복] 나와 아버지 사촌형제 자녀 사이는 몇 촌 일까요?
‘내(內)’는 아버지의 여자형제인 고모 쪽에 붙는 호칭으로 고종사촌=내종사촌
시동생이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일땐 ‘서방님’으로 불러야 제대로 된 호칭
각자의 생활에 바쁜 현대인에게 설날은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자리다. 그런데 즐겁고 뜻깊은 이 자리에서 촌수와 호칭을 헷갈리는 모습을 쉽게 만난다.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라면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숙제다. 하지만 어렵게만 보이는 촌수와 호칭도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쉽다는 사실. 지금부터 가족관계도를 읽는 노하우를 익혀보자.
#1. 평소 활달한 성격의 현미래 씨. 3년간 열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젖어 있지만, 다가오는 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차례를 지낼 음식 마련은 어찌어찌 한다 해도 평소에 왕래가 드물던 먼 친척들까지 설을 맞이해 시댁으로 찾아올 텐데 촌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감이 잡히질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말수 없고 얌전한 새댁’ 노릇만 하다가 와야 할지도 몰라 걱정이다.
#2. 여느 엄마들처럼 자녀교육에 열심인 주부 10년 차 고전미 씨. 평소에도 초등학생 두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자상한 엄마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내준 숙제를 보곤 아득해졌다. 탐구생활의 주제는 ‘일가친척 사이의 촌수와 올바른 호칭’을 조사하는 것. 늘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하면서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머쓱하니 딴청을 부린다. 식당 아줌마가 ‘이모’이고, 마트의 아르바이트 남학생이 ‘삼촌’인 줄 아는 아이들에게 자신도 잘 모르는 친척 사이의 호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은 한가위와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힌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설이 되면 집안 어른이 계신 집에는 평소 왕래가 뜸하던 먼 친척들까지도 세배를 드리러 오곤 한다. 4촌만 넘어가도 잘 모르는 게 요즘 세상. 이러니 어린 자녀가 찾아온 친척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슬그머니 다가와서 “엄마 근데 나와 어떻게 돼?”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주고 “아빠의 가까운 친척이야”라고 얼버무리기 일쑤다.
4촌 형제들 얼굴 보기도 가물가물한 세상에서 이보다 먼 인척이라면 촌수 계산도 쉽사리 안 될 터이고, 당연히 호칭도 낯설다. 어쩌다 부모님 모시고 친척집 경조사라도 가게 되면 ‘대고모(大姑母)’ ‘재종숙부(再從叔父)’ ‘내재종숙(內再從叔)’ ‘외종숙(外從叔)’ 등 소개받는 친척에게 ‘네, 네’ 하며 건성으로 인사를 드릴 뿐 암호 같은 호칭 때문에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십상이다.
이번 설을 기회로 촌수와 호칭에 대해 한번쯤 알고 넘어가보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촌수와 호칭에도 원리가 있다. 이 원리만 알면 비교적 쉽게 촌수와 호칭을 이해할 수 있다.
촌수 계산, 민법에도 있다고?
제대로 된 호칭을 알려면 우선 촌수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촌수는 ‘혈연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호칭과는 구분된다. 세계의 다양한 친족호칭체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친족 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혈족이란 직계존비속(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상 방계혈족)을 말한다. 그리고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호칭을 알기 전에 먼저 촌수부터 정리해보자.
할아버지가 나와 2촌이라고?
촌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자식 사이는 1촌, 형제자매 사이는 2촌’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나와 몇 촌인가? 조부모와 자신의 촌수를 묻는 질문에 성인의 대부분이 ‘2촌’이라고 답한다. ‘아버지와 내가 1촌 관계이니 그 윗대인 조부모는 당연히 2촌이겠지’라는 생각에서다. 그렇다면 증조, 고조 등 세대가 올라갈수록 촌수가 멀어져 민법의 친족 규정을 적용한다면 9대조 조상부터는 아예 ‘남’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
직계혈족 간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게 맞다. 실제로도 촌수 대신 세(世)나 대(代)를 쓴다. 한 대가 올라갈수록 1촌을 더하는 촌수 계산법은 방계친족 간에 쓰는 것이지 직계혈족에게는 옳지 않다. 다만 방계혈족과의 촌수를 계산하기 위해 편의상 한 대마다 1촌씩 간주할 뿐이다. 형제자매 사이를 2촌으로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나의 촌수는 2촌이 아니라 1촌이며, 이는 증조와 고조 등 대를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한편 촌수는 친족간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만큼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인 부부는 무촌이 되는 것이다.
삼촌도 삼촌, 이모와 고모도 삼촌?
촌수에 대해 대충 알아봤으니 친척 간에 부르는 호칭을 알아보자.
4촌 이내 친족들끼리의 호칭을 헷갈리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터다. 다만 무심코 범하기 쉬운 잘못된 호칭에 대해서만 짚어보겠다.
흔히 아버지의 손아래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촌수는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니 ‘삼촌’이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고모나 이모도 ‘삼촌’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칭은 아버지의 손위 형제이면 ‘큰아버지’나 ‘백부’, 손아래 형제면 ‘작은아버지’나 ‘숙부’라 칭해야 옳고, 엄마의 남자 형제는 ‘외숙부’라고 해야 한다. 다만 ‘삼촌’이라는 호칭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서 이미 굳어졌기에 ‘아버지의 미혼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외삼촌)를 부를 때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칭공식:‘종·재종·외’만 알면 호칭이 보인다
4촌을 벗어나게 되면 호칭 문제가 녹록지 않다. 그러나 수학공식처럼 호칭에도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종·재종·외’라는 공식만 알아두면 적어도 어떤 관계인지 몰라 당황할 일은 없어진다.
복잡한 친족관계에서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를 뜻한다. 다만 ‘숙’의 경우 부계 쪽에서는 촌수의 대상보다 나이가 많으면 ‘백(伯)’이라 호칭한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는 나와 4촌 형제인데, 다른 말로 ‘종형제’라고도 한다. 그리고 ‘재종’은 아버지 4촌 형제의 자녀와 나와의 사이, 즉 6촌 형제를 부르는 말이다. 8촌과 10촌으로 멀어지면 삼종형제, 사종형제가 된다.
윗대를 호칭할 때는 한 단계씩 앞당겨 종을 붙이면 된다. 3촌지간인 아버지의 형제를 ‘백부’나 ‘숙부’로 불렀으니, 아버지의 4촌 형제는 ‘종 백·숙부’, 6촌 형제는 ‘재종 백·숙부’, 8촌 형제는 ‘삼종 백·숙부’가 되는 것이다.
‘내’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 즉 고모 쪽에 붙는 호칭이다. 흔히 고모의 자녀와 나의 사이를 ‘고종사촌’이라고 하는데, 촌수에 맞는 호칭은 ‘내종사촌’이다. 앞서의 ‘종형제’에 ‘내재종형제’ ‘내삼종형제’처럼 ‘내’자를 붙이면 고모 쪽 호칭이 된다. 마찬가지로 윗대에 대한 호칭은 촌수에 따라 ‘내종숙’ ‘내재종숙’ 등으로 호칭한다. 다만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고 불렀듯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내게 ‘대고모’가 되고, 증조할아버지의 여자 형제라면 ‘증대고모’가 된다.
이미 눈치 챘겠지만 ‘외’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 쪽에 붙는 호칭이다. 우리가 흔히 외사촌간이라고 부르는 외숙부의 자녀는 나와 ‘외종형제’이고, 앞서처럼 ‘외재종형제’ ‘외삼종형제’ 등으로 퍼져나간다. 다만 어머니와 자매관계인 경우 ‘이모’라고 부르듯 이모의 자녀와는 ‘이종형제’라고 한다.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윗대에는 촌수에 따라 ‘외종숙’ ‘외재종숙’이라 부른다.
실수하기 쉬운 가까운 사이의 호칭 예절
배우자 가족에 대한 호칭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배우자보다 항렬이 높은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대하는 것이 전통이다. 아내의 남자 형제는 ‘처남’이라고 부르는데, 아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내키지 않으면 그냥 ‘처남’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아내의 여자 형제 중 언니는 ‘처형’, 동생은 ‘처제’라 부르고, 형부가 나이 어린 처제에게 처음부터 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례다.
남자 형제 입장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제수’나 ‘계수’, 형의 아내는 형수,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나 매제 혹은 ‘~서방’으로 부르면 무난하다. 누나의 남편은 원래 ‘자형’이 올바른 표현이지만 최근에는 매형, 매부가 더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동생을 삼촌으로 부르는 것도 잘못된 호칭이다.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이 제대로 된 호칭이다. 남편의 형은 결혼과 상관없이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자 형제의 경우 오빠의 아내는 나이가 어려도 ‘언니’이며 어색하면 ‘올케’라 해도 무방하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 ‘자네’ 등으로 부른다. 다만 ‘연상연하 커플’이 늘어나다 보니 남동생의 아내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말은 높이되 호칭은 ‘올케’로 하는 것이 좋다. 역으로 남편의 누나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라고 부르며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다.
이 바쁜 세상에 촌수는 왜 따지고, 편하게 부르면 되지 호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면서 친소 여부에 따라 친근하게도, 다소 경직되게도 부를 수 있는 것과 몰라서 예의에 벗어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 호칭에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 올바른 호칭 사용은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하재광<자유기고가>
출처: http://blog.daum.net/kkwoo5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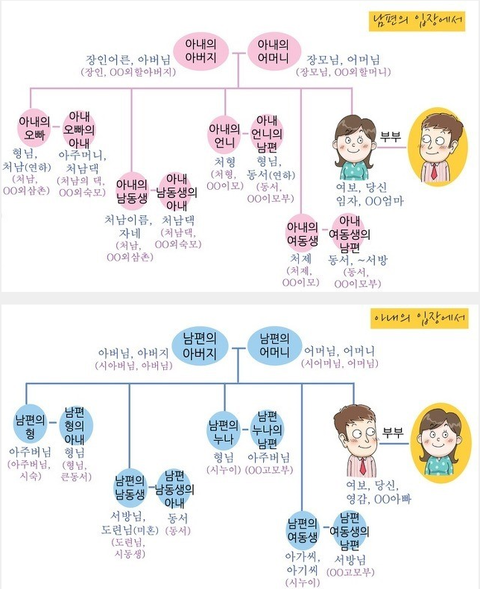

- www.love-119.com > 커뮤니티 > 알면도움이 되는 상식
'좋은 글 모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사 한 마디가 (0) | 2018.02.12 |
|---|---|
| [친족·친척 촌수·호칭 완전정복] (0) | 2018.02.11 |
| 행복엔 나중이 없다! (0) | 2018.02.10 |
| 주는 사랑, 나누는 기쁨- (0) | 2018.02.08 |
| 알아두면 유용한 한자상식 (0) | 2018.02.07 |